 |
진중권의 이매진
| ㅣ저 자ㅣ | 진중권 |
| ㅣ출판사ㅣ | 씨네21 |
| ㅣ발행일ㅣ | 2008. 12. 25 |
| ㅣ페이지ㅣ | 288쪽 |
ㅣ정 가ㅣ | 13,000원 |
| 출판사 서평 | 이것은 영화 비평이 아니다. 새로운 담론의 놀이다. “디지털과 테크놀로지는 이미 우리 일상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우린 아직도 이에 맞는 철학을 발견하지 못했다. 미학자 진중권이 그 가능성을 유쾌하게 탐색한다. 이제 예술, 영화를 읽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
| 이형중 한양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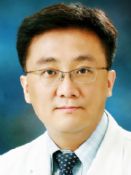 |
골프와 폭탄주의 마초 정치성을 구현하기에는 너무 올곧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엔 마음의 여백이 없기에 독서나 영화감상처럼 혼자 하는 기호생활을 즐기다 보니 달변이나 일필휘지로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부럽기만 하다.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내게 있어 진중권 선생은 논리와 감성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쾌도난마의 촌철살인 필력으로 무장한 화룡점정의 마타도어이다. 그의 글은 직설적이지만 성급하지 않으며 수미쌍관의 미학을 유지하는 다카포 혹은 달세뇨 식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제4악장 Allegro con fuoco이다. 폭력과 상스러움, 교수대 위의 까치, 미학 오디세이에서 시작된 진중권 표 비블리오테크는 연구실에서도 항상 내 손이 닿는 지정학적 근접성을 점하여 읽을수록 곱씹게 만드는 오프라인 위키피디아가 되었다.
매순간 긴장을 풀기 힘든 뇌혈관외과의사로 살다보니 호사스러운 여가생활은 기대하기 어려워 틈틈이 보는 영화로 과민해진 오감을 이완시키게 된다. 다른 의사들이 같은 질환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해지듯이 평론가들은 영화를 본 후에 프레임 안과 밖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철학자, 인문학자로서 사고의 회색지대에서 자기 식으로 방점을 찍는 진중권 선생이 영화와 조우하는 방식이 기대되었다.
영화는 형식으로 내러티브의 디테일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매체이다. 즉, 피사체를 아래에서 비추는 것으로 그의 왜소함을 알 수 있고, 얼굴 한 쪽만 조명을 가하여 불안정한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책은 영화평론이 아닌 인문학적 담론의 기술로서, 향후 디지털 기술이 시네마의 내용과 형식을 어떤 식으로 변조할지, 또 과학과 인문학이 어떤 방식을 통해 영화적 상상력으로 변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숏의 몽타주로 이루어진 영화는 유기적 전체성을 가진 연극과 달라 피사체의 파편적 연기를 요구한다. 발터 베냐민의 말처럼 관객이 있던 자리에 카메라가 들어서면 연기자 뿐 아니라 그가 그려내는 인물의 아우라도 파괴되며, 영화제작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피사체를 포함한 고전적 의미의 미장센도 해체된다.
터미네이터, 매트릭스를 거쳐 베오울프, 트랜스포머, 아바타로 이어진 복제가 실체를 대신해버린 시뮬라크르의 도래에 관객들은 열광하지만 감독은 이를 위해 화면의 대부분을 고해상의 이미지로 채워 넣는 현상학적 구체화를 실현해야만 한다.
앙드레 바쟁이 영화의 본질이라고 파악했던 지속성 이외에 객관성이란 재현 대상의 존재를 믿도록 강요하며 촬영된 대상은 마치 지문처럼 모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실 그 이상의 하이퍼리얼한 창조물인 디지털 분라쿠는 2% 부족한 재현상의 섬뜩함을 의미하는 언캐니 밸리 혹은 부키미노 타니를 미학적으로 뛰어 넘어야만 한다.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는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사이버 펑크영화이다. 영화의 주제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복제인간 리플리컨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처에 신화적 해석과 의도적 흘림의 여지를 남겨둔다. 이 영화가 울트라모던한 배타성이 아닌 포스트모던한 포괄성, 무정체성을 추구했다는 점은 공간적으로는 미래와 과거의 분열증적 결합으로 구축되었고 세트는 여러 시대와 문명에서 차용한 혼성모방으로 구성되며 플롯은 가상과 실재 구별의 사라짐을 일컫는 후기구조주의의 담론으로 입증된다.
블록버스터의 탈을 쓴 채 절대진리를 함구하고 아키라의 해석과 데리다의 해체와의 경계에서 관객을 시험에 들게 한 메멘토, 인셉션은 텍스트를 뒤로 진행하면서 펼치는 선형적 서사를 무시하고 단선적 해석을 포기한 다중인격적 라쇼몽 효과를 선택한다. 진리란 원래 존재하면서 부재하는 것이지만 인간들은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역사적 사실을 써내려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책의 마지막 장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는 우리에게 역사 밖의 진지한 관조자로 남을 것인지, 역사 안으로 무지한 행위자로 들어갈 것인지 질문한다. 신이 셋이면서 종국에는 하나가 되듯이 역사, 이야기, 영화의 천사도 셋이면서 하나가 됨을 상기시킨다. 영화는 역사를 만드는 현대의 이야기이며 “우리는 (역사에) 올라탔다.”라고 속삭인다.
이 책 이매진은 결국 현란한 인문학적 수사를 동원하여 브레히트의 소격효과처럼 관객의 몰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아들 유지의 손에 들려있던 그림책 아카이브 별 전설처럼 스스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는 친절한 인지적 단절감을 선사한다. ◈

